
又(또 우), 爪(손톱 조)를 보고 각각 손의 느낌을 비교해 볼게요.
1. 又 (또 우)

又(또 우)는 본래 오른손을 표현한 글자예요. 갑골문부터 소전체를 보면 손가락을 세 개로 줄여서 포크처럼 표현했어요. 손목과 팔뚝도 잘 나타나 보이죠. 해서체에서는 어떤 것을 꽉 쥐는 느낌처럼 표현되었어요.
又(또 우)는 자주 쓰는 「 오른손 」이란 뜻에서 이후에 「 또 」라는 뜻으로 가차 되었어요.

다른 글자와 같이 구성될 때는 이렇게 무언가를 잡는 손의 뜻으로 쓰이는데 본래 모습 그대로 쓰이기도 하고 벼를 잡은 秉(잡을 병)이나 붓 잡은 모습인 聿(붓 율)처럼 옛 글자체처럼 변형해서 구성될 때도 많아요.

又(또 우)는 옛 문헌에선 자주 쓰여졌지만 일상에선 잘 쓰여지진 않아요.
2. 爪 (손톱 조)

갑골문과 소전체에선 손등부터 손가락을 연결한 유려한 선이 특징이고 금문에선 손톱을 세운 모습이 잘 표현되었어요. 금문에서 손톱을 빼면 又(또 우)와 비슷하죠. 해서체에서는 세운 손등과 손가락 모습이 잘 나타나 보여요.
爪(손톱 조)는 글자 구성에서 그대로도 쓰이지만 획을 짧게 하여 爫로 더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또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㕚로도 쓰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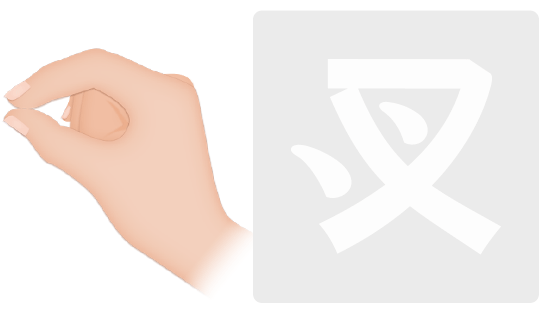
재밌게도 㕚에 虫(벌레 충) 부수 가 같이 구성되면 따끔따끔 무는 蚤(벼룩 조) 가 돼요.
또 여기에 手(손 수)→扌 부수가 같이 구성되면 능력을 발휘하는 손이 손등을 세워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는 搔(긁을 소)가 되고
馬(말 마) 부수 가 같이 구성되면 따금한 통증에 말이 놀라 소란 피우는 騷(떠들 소) 가 되요. 진짜 재밌죠.
※ 㕚와 비슷한 글자로 손가락 사이에 무언가 끼어져 있는 듯한 모습인 叉(깍지 낄 차/갈래 차)가 있는데 무언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모습에서 金(쇠 금) 부수가 같이 구성되면 머리모양을 고정시키는 釵(비녀 채)가 되고 手(손 수)→扌 부수가 같이 구성되면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서 집는 扠(집을 차/작살 차)가 되요.

爪(손톱 조) 는 손톱의 특징을 살려 抓(긁을 조) , 爬(긁을 파) 처럼 「 긁다 」, 「 할퀴다 」 뜻으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爪(손톱 조)는 又(또 우)처럼 무언가를 잡는 손으로도 쓰여요.

※ 똑같이 잡는 손이라도 又(또 우)와 爪(손톱 조)가 구성된 글자들을 비교해 보면
又(또 우)는 욕심껏 잡는 느낌이 강하고 爪(손톱 조)는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선택의 의미가 더 강해요.


먼저 익힌 又(또 우), 爪(손톱 조)의 느낌을 생각하면서
木이 동일하게 구성된 桑(뽕나무 상), 采(풍채 채)를 비교해 볼게요.
3. 桑 (뽕나무 상)

桑(뽕나무 상)을 보면 木과 함께 又가 세 개씩이나 구성되었어요. 무언가를 마구 잡는 느낌이 오죠.
갑골문을 보면 나무 위에 손 아닌 가지에 난 무성한 잎을 표현했고 소전체부터 손이 등장해요.
桑은 뽕나무 잎을 따고 따고 또 따는 모습이에요.
뽕나무 잎은 누에의 유일한 먹이가 되는데 누에고치에서 나온 명주실은 명주를 짜는 원료가 돼요.
비단이라고도 불리죠.


누에는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먹기만 하니 명주실을 얻기 위해서는 뽕잎을 열심히 따야 했어요.
비단은 우리가 흔히 입는 옷감인 면 보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부터 누에를 키우고 명주 짜는 일은 나라에서 권장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뽕나무를 심고 키우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 桑((뽕나무 상) 쓰임
桑(뽕나무 상)은 이젠 일상에서 잘 사용하진 않지만
상전벽해(桑田/밭 전碧/푸를 벽海) :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다'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바뀐 것을 말함
사자성어는 종종 사용해요.
4. 采 (풍채 채) 採 (딸/캘 채)

采(풍채 채)는 본래 나무 열매 따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예요.
갑골문을 보면 나무에 열린 동그란 열매와 따는 손이 있고 금문에선 따는 손 모양이 아주 실감 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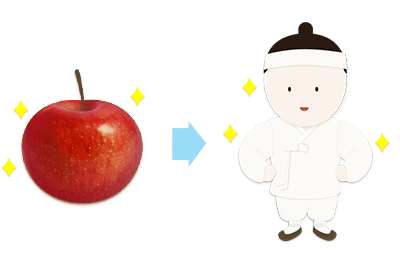
우리가 열매를 딸 때는 보기 좋게 잘 익은 것으로 골라서 따죠.
采은 점차 사람의 좋은 모습을 나타내듯 「 따다 」 뜻에서 사람의 겉모습을 뜻하는 「 풍채 」로 더 많이 쓰이게 되었어요.
본래의 「 따다 」 뜻은 手→扌을 더한 採 로 나타내게 되었어요.

또 동글동글 보기 좋은 먹거리는 나무 말고도 땅에도 많이 있죠. 採는 「 캐다 」 뜻으로도 쓰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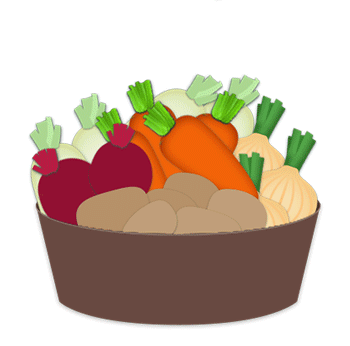

* 采(풍채 채)가 구성된 글자들의 특징
采가 구성된 글자들을 보면 탐스럽게 잘 익은 열매를 따는 것처럼 전체에서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艸(풀 초)→艹 부수가 같이 구성되면 採처럼 풀 중에서 먹는 풀을 캐는 菜(나물 채) ,
→ 채소(菜蔬/나물 소), 야채(野/들 야菜)...
털, 무늬, 빛, 소리도 표현하는 彡(터럭 삼) 부수와 같이 하면 빛에서도 아름다운 빛깔인 彩(채색 채) ,
→ 색채(色/빛 색彩), 광채(光/빛 광彩)...
또 잘 쓰이지 않지만 재밌는 글자로
실과 천을 표현하는 糸(실 사) 부수 가 같이 구성되면 천에서도 아름답게 광택이 나는 綵(비단 채) ,
目(눈 목) 부수가 같이 구성되면 전체에서 한 곳을 집중해서 보는 睬(주목할 채) 가 돼요. 재밌죠^^
* 采(풍채 채) , 採(딸/캘 채) 쓰임
采(풍채 채)는 풍채(風/바람 풍采) 이외에는 일상에서 잘 쓰이지 많지만
採(딸/캘 채)는
채택(採擇/가릴 택) : 몇 가지 중 골라 뽑음,
채점(採點/점 점) : 맞는 답만 골라 점수를 매기여 점수를 정함,
채집(採集/모일 집) : 동식물, 광석 등을 모음,
채혈(採血/피혈) : 피를 뽑는 일,
채용(採用/쓸 용) : 사람을 뽑아서 씀,
공채(公/공평할 공採) :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어 사람을 채용,
등에 쓰여요.
※ 참고 문헌 :
* 「한자어원사전」 하영삼 저
* 「갑골문고급자전」 허진웅 저 / 하영삼,김화영 역
* 「완역 설문해자」허신 저 / 하영삼 역
※ 참고 사이트 : * Chines Etymology 字源
'맘짜랑 Step by Step'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tep9-① 발 ] 止(그칠 지) 企 (꾀할 기) 正 (정할 정) 之(갈 지) (0) | 2023.04.25 |
|---|---|
| [step8-③ 손 ] 奴(종 노) 妥(온당할 타) 取(가질 취) 受(받을 수) 授(줄 수) (0) | 2023.04.18 |
| [step8-① 손 ] 手(손 수) 拜(절 배) 看(볼 간) (2) | 2023.04.10 |
| [step7-④ 먹거리 ] 瓜(오이 과) 孤(외로울 고) 肉(고기 육) (0) | 2023.04.06 |
| [step7-③ 먹거리 ] 來(올 래) 麥(보리 맥) 米(쌀 미) 豆(콩 두) (0) | 2023.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