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천)를 짜기 위해서는 먼저 실을 만들어야 하죠.
천연실을 크게 분류해 보면
①누에고치에서 뽑아낸 명주실(견실),
②마(삼)식물의 줄기 껍질을 쪼개 이은 삼실(마실),
③목화솜에서 자아낸 무명실(면실),
④낙타, 염소, 양처럼 동물의 털로 만든 모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주된 한자 문화권에서는 기후 특성상 명주실과 삼실로 짠 견직물𝛂과 마직물𝛂 을 많이 이용해 왔고 특히 견직물(명주/비단)은 은은하고 아름다운 광택을 가지고 있어서 귀족층에서 많이 애용했어요.
견직물과 마직물이 일상 생활에 밀접했기에 한자에는 누에, 명주, 마와 관련된 글자가 많이 있어요.
※ 목화는 열대성 식물로 BC 6세기경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되어 한자 문화권에서는 면직물이 다른 직물에 비해 그 역사가 짧아요.

[STEP11]에서는 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실에 관한 글자를 볼게요.

1. 幺(작을 요), 絲(실 사), 糸(가는 실 멱)
1) 幺 (작을 요)
幺(작을 요), 絲(실 사), 糸(가는 실 멱) 글자체가 비슷하죠. 전부 실을 표현한 글자예요.
幺(작을 요)는 가장 작은 실타래 단위를 표현했는데 본래 「실」 뜻 보다 「 작다, 어리다, 막내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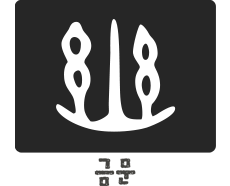
幽(그윽할 유)의 금문을 보면 山(뫼 산)이 아닌 火(불 화)와 幺로 구성되어
등잔에 있는 심지가 불 밝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여기서 幺는 실로 만든 심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초를 켜면 분위기가 그윽하죠.
2) 絲 (실 사)
幽(그윽할 유)에서 幺(작을 요)가 실 한가닥의 작은 느낌을 표현했다면 두툼한 실 묶음은 絲(실 사)가 담당하고 있어요.

3) 糸 (가는 실 멱)
絲 금문을 보면 실타래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이 보이죠.
부수로 구성될 때는 糸(가는 실 멱)으로 쓰여지고 「실, 끈(줄), 이어지다, 끊임없다…」 뜻을 나타내요.
* 絲 → 견사(繭/고치 견絲), 나사(螺/소라 라絲), 철사(鐵/쇠 철絲), 나사(螺/소라 라絲) …
* 幽 → 유령(幽靈/신령 령), 유폐(幽閉/닫을 폐) …

2. 系(이을 계), 繼(이을 계)
1) 系 (이을 계)
系(이을 계)의 갑골문을 보면 여러 갈래의 실을 손으로 잡고 있어요. 고치실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여러 고치실을 모아 실로 엮는 장면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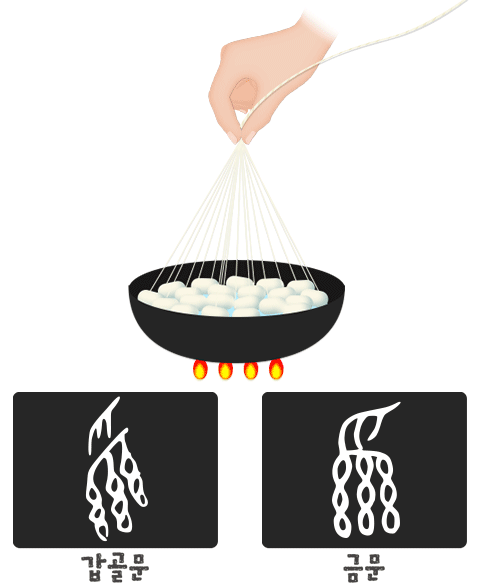
한 고치에서 나오는 실의 길이가 약 1200~1300m𝛂나 된다고 해요. 굉장하죠.
소전체부터 손(爪)이 丿(삐침별)로 간략화 되어 실이 끊임없이 쭈욱 이어지는 느낌이 더 확실히 들어요.
系는 「잇다, 계보…」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 系에 子(아들 자) 부수가 같이 구성되면 자손이 끊이없이 이어지는 孫(손자 손) ,
人(사람 인)→亻 부수가 같이 구성되면 사람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係(맬 계) 가 되요.
* 系 → 계통(系統/거느릴 통), 계열(系列/벌일 렬), 계보(系譜/족보 보), 체계(體/몸 체系), 부계(父/아버지 부系), 모계(母系) …
* 孫 → 자손(子孫), 후손(後/뒤 후孫), 종손(宗/마루 종孫), 증손(曾/일찍 증孫) …
* 係 →관계(關/관계할 관係) …
2) 繼 (이을 계)
繼(이을 계) 금문을 보면 二𝛂가 등장해 끊어진 실을 베틀의 다른 실들과 같게 잇는 모습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소전체부터 糸부수가 같이 구성되어 이어지는 느낌이 더 강조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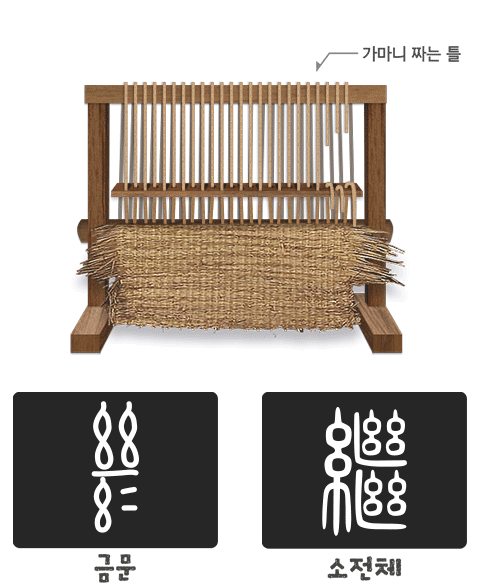
繼는 끊어진 부분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잇다, 계속하다, 지속하다 …」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 반면 㡭(이을 계)에 생활필수품이었던 斤(도끼 근)이 구성되면 실을 잇지 않고 끊어내는 斷(끊을 단) 이 되요.
* 繼 → 계속(繼續/이을 속), 후계(後/뒤 후繼), 중계(中繼), 인계(引/끌 인繼), 계모(繼母), 계주(繼走) …
* 斷 → 단절(斷絶/끊을 절), 단면(斷面/얼굴 면), 차단(遮/막을 차斷), 횡단(橫/가로 횡斷), 단식(斷食/밥 식), 단념(斷念/생각 념) …

3. 㬎(드러날 현), 濕(젖을 습)
1) 㬎 (드러날 현)


㬎(드러날 현)은 어렵게 키워낸 고치를 물에 삶아 뽑아낸 실(絲)을 햇볕(日)에 말리는 모습이에요.
드디어 고치에서 실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젖은 실타래가 햇볕에 반짝이는 듯 하죠. ^^
2) 濕 (젖을 습)
아직 마르지 않은 젖은 실타래이기 때문에 水(물 수)→氵부수와 같이 구성되면 濕(젖을 습)𝛂이 되요.
* 濕 → 습기(濕氣/기운 기), 습진(濕疹/홍역 진), 습지(濕地/땅 지), 보습(保/보전할 보濕), 방습(防/막을 방濕) …

4. 幻(변할 환 / 헛보일 환), 亂(어지러울 란)
1) 幻 (헛보일 환 / 변환 환)
幻(변환 환 / 헛보일 환)의 금문을 보면 실이 쭈욱 이어진 모습처럼 표현되었고
소전체에선 베틀의 북에서 실이 빠져 나오는 모습처럼 표현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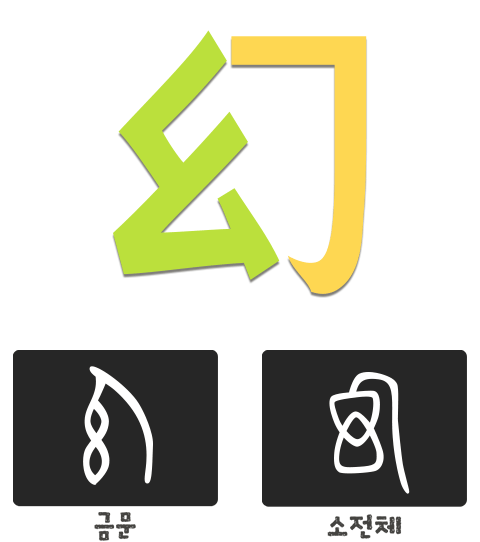

누에고치에서 실이 만들어지는 장면과 베틀북에서 실이 나와 천이 만들어져 가는 장면을 떠올리면
「변화」 뜻이 쉽게 이해되죠.
해서체에서는 幺(작을 요)와 실이 빠져 나오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𠃌 글자체와 같이 구성되었어요 .
幻은 「변화」 에서 확장된 「요술→ 헛보이다→ 미혹하다→ 환상」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 幻 → 환상(幻想/생각 상), 환시(幻視/볼 시), 몽환(夢/꿈 몽幻), 환각(幻覺/깨달을 각), 환청(幻聽/들을 청), 환멸(幻滅/멸할 멸) …
2) 亂(어지러울 란)
亂(어지러울 란)의 금문을 보면 양손으로 실패에 엉킨 실을 푸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어요. 실, 실패, 양손(爫,又)이 잘 보이죠.
엉킨 실을 풀려면 정말 눈이 어질어질 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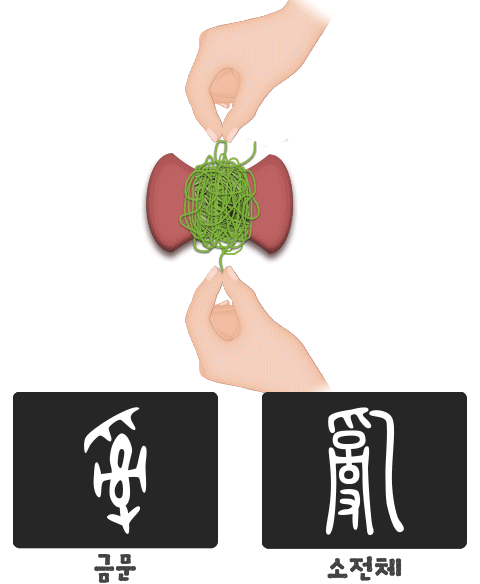
해서체에서는 𤔔(어지러울 란)과 실이 엉켜 잘 풀리지 못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乙(새 을)→ 乚(乙이체자) 이 같이 구성되었어요.
※ 𤔔에 사람 고문할 때 쓰이는 칼인 辛(매울 신)과 같이 구성되면 어려운 말은 끊어내고 쉬운 말로 술술 풀어내는 辭(말씀 사) , 辭는 실을 끊어내듯 「떠나다, 사퇴하다, 사양하다」 뜻으로도 쓰여요.
* 亂 → 혼란(混/섞일 혼亂), 난리(亂離/떠날 리), 소란(騷/떠들 소亂), 반란(叛/배반할 반亂), 음란(淫/음란할 음亂), 내란(內/안 내亂), 광란(狂/미칠 광亂), 일사불란(一絲不/아닐 불亂) …
* 辭 → 사전(辭典/법 전), 찬사(讚/기릴 찬辭), 취임사(就/나아갈 취任/맡길 임辭), 사임(辭任/맡길 임), 사퇴(辭退/물러날 퇴), 사표(辭標/겉 표) …
※ 참고 문헌 :
* 「한자어원사전」 하영삼 저
* 「갑골문고급자전」 허진웅 저 / 하영삼,김화영 역
* 「완역 설문해자」허신 저 / 하영삼 역
※ 참고 사이트 :
* Chines Etymology 字源
* 네이버 사전
'맘짜랑 Step by Step'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tep10 사람Ⅱ] 儿(어진사람 인) (0) | 2023.06.20 |
|---|---|
| [step9-③ 발 ] 走(달릴 주) 辵(쉬엄쉬엄 갈 착) (0) | 2023.05.26 |
| [step9-② 발 ] 足(발 족) 疋(발 소) (0) | 2023.05.07 |
| [step9-① 발 ] 止(그칠 지) 企 (꾀할 기) 正 (정할 정) 之(갈 지) (0) | 2023.04.25 |
| [step8-③ 손 ] 奴(종 노) 妥(온당할 타) 取(가질 취) 受(받을 수) 授(줄 수) (0) | 2023.04.18 |





댓글